필자가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뎠던 80년대 후반쯤이었을까.
취중에 선배로부터 ‘하늘에서는 파일럿, 바다에서는 마도로스, 땅에서는 기자’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기자’는 ‘무관(無冠)의 제왕(帝王)’이라는 취지였다.
당시엔 언론의 막강한 힘과 책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던 때였다. 기자는 펜 한 자루를 들고 시대의 어둠을 고발하는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그 후로 한참이 지나서였다.
어쩌면 요즘처럼 기자가 흔해진 세상에서는 이 말이 지나친 수사(修辭)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오죽하면 우리의 일부 기자들은 ‘기레기’로 불리는 치욕을 당하며 그 고단한 ‘기자질’을 하고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기레기’는 '기자+쓰레기'의 합성신조어다. 돈이 신(神)이 되어버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얼핏 돈을 제일 많이 쥔 자가 '무관의 제왕'으로 보이니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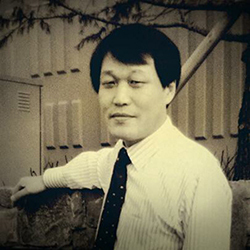
4월 7일. 오늘은 제66회 ‘신문의 날’이다.
‘독립신문’창간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인데 언론인들에게는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 등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는 싫든 좋든 그야말로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이 지면이든 컴퓨터를 통해서든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신문이 아닌가 싶다.
때로는 신문 속의 세상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무더운 여름 한줄기 소나기처럼 청량제(淸凉劑)가 되어줄 때도 있으니 수많은 ‘무관(無冠)’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최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실시한 ‘현직 기자들의 트라우마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설문에 따르면, 현직 기자 10명 중 8명은 근무 중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들은 취재 과정뿐 아니라 보도 이후 댓글·이메일 등 뉴스 소비자의 반응,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도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이 업무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기사의 품질, 나아가 언론사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현장에선 기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곤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기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언론계가 나서 트라우마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후속 지원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자사회에서 트라우마는 별것 아닌 일로 치부되지만, 이미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읽혀진다.
필자는 이 조사결과를 언론 문화 차원에서 다뤄 언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司馬遷)은 "공자는 평생 높은 벼슬을 오래 하지 못했고 현실에 좌절하고 떠돌아 다녔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떠받든다"라고 평가하면서 공자에게 ‘무면지왕(無冕之王)’이란 칭호를 부여해줬다. 또한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자의 생활을 왕이나 제후만 기록하는 ‘사기’의 '세가(世家)' 편에 분류해 사실상 제후와 동급으로 평가했다.
‘기자’라는 직업은 겉으론 화려할지 몰라도 사실 외로운 직업이다. 그러나 올바른 기자라면 사마천의 말처럼 독자에게 떠받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자'가 비록 제후와 같은 등급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지만 적어도 ‘무관(無冠)의 필마(匹馬)’정도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상정해 본다.
관련기사
- [한기원 칼럼] 윤설열 당선인의 ‘사랑학개론’
- [한기원칼럼] ‘호환(虎患)’의 지방선거, 몸 다는 후보자들
- [한기원 칼럼]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실험
- [한기원 칼럼] 아, 외연도(外煙島)!
- [한기원 칼럼] 사랑방 손님에서 주인으로, 윤석열!
- [사설] 정치는 국민과의 '계약‘, 국힘 ‘연패제한’은 '공정' 아니다
- [사설] ‘里長(이장)’이라는 자리
- [사설] 대덕구 공무원 증원, 재검토가 필요하다
- [사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다
- [사설] 국민이 지쳤다, 이젠 ‘화합’이다!
- [사설] 조국 전 장관, ‘자숙(自肅)’이 ‘답’이다
- [사설] '검수완박',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 한국사립대교수노조, ‘대통령직 인수위에 바란다’성명 발표
- [한기원 칼럼] ‘절연(絶煙)’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