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 강행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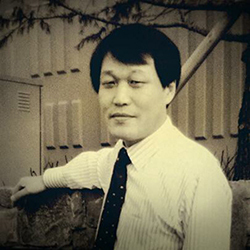
‘묘항현령’(猫項懸鈴).
우리는 흔히 실행에도 옮기지 못할 일을 공연히 논의한다는 상황을 빗대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쥐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2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단체장을 지방의회에서 뽑자고 하는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사실상 ‘간선제’인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와는 아무 관련 없이 단순히 관련법안의 후속 입법 차원인데 아무리 그래도 국민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그 발상이 딱하기는 하다.
행안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원자(지방의원 제외)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안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가운데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안 △지자체장의 선출방식은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달 초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상대로 3개 권역별 온라인 설명회를 처음 연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의 권력 독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과 그동안 어렵게 이어온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비등한데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의견 수렴이라는 비판여론이 팽배하다.
우리는 그동안 주민 다수의 의견으로 관철된 지자체장의 직선제를 간선제로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한마디로 ‘시기상조’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장까지 선출한다면 막강한 의회 권력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부작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나 그동안 우리 국민정서상 모든 선거제도는 ‘직선제’를 근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역사의 굴곡앞에 ‘국민의 피’로 얻은 민주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재로선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한 결론은 다음 정부로 넘어간 듯하다.
우리는 자치단체장의 간선제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선거 후보자의 국회의원 줄서기부터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
공천을 둘러싼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그 자체가 지방의회의 중앙 예속화때문일 터이다.
말로는 ‘풀뿌리 선거’라고 하면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뽑으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겠느냐는 지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의 입맛에 따라 공천이 좌우되는 지방선거가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씁쓸한 현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시 짚어 볼 시점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언제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풀뿌리인 지역주민 앞에 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하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간선제’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은 명료하다. 그것은 헌법 제1조 2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관련기사
- [한기원 칼럼] '충청권메가시티' 여야 대선후보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 [한기원 칼럼] 슬기로운 '대통령후보 생활'
- [한기원 칼럼] 배우 김영철 ‘빨강 목도리’와 개그맨 강성범의 ‘돌직구’
- [한기원 칼럼] '그대도, 언론을 조심하라고!'
- [한기원 칼럼] 사전투표에 쏠린 ‘눈’
- '깜깜이 대선판' 주말, 당락 분수령 될 듯
- '빅데이터'가 출렁였다
- [한기원 칼럼] 후보 부인 사라진 '이상한 대선'
- [사설] '투표합시다'
- [한기원 칼럼] 사랑방 손님에서 주인으로, 윤석열!
- 6.1 지방선거 ‘시즌 오픈’
- [사설] 尹 당선인 인수위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 [한기원칼럼] ‘호환(虎患)’의 지방선거, 몸 다는 후보자들

